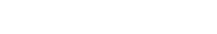1930년대 만주, 추격전, 그리고 중국 로케이션. 이런 키워드만 들어도 고생 참 많이 하겠다 싶었다. 배우 이병헌에게도
<놈.놈.놈>은 모험과 도전에 가까운 작품이었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
역시 처음 해 보는 경험이 많았다. 악역도, 그렇게 오랜 시간 해외 촬영을 해본 것도, 말을 타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모험이었다,
도전이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긴 하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김지운 감독이 생각하는 ‘창이’와 자신이 생각하는 ‘창이’가 서로 일치되는 면이 있었나?
보통 작품 들어가기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대화로 풀고 일치시켜 표현해 나가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김지운 감독과는 <달콤한
인생> 때 워낙 그런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달콤한 인생>은 한 인물의 심리를 디테일하게 따라가는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했었다. 그 때부터 둘이 쿵짝이 잘 맞아서 좋은 콤비가 된 거 같다. 이번 영화를 하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창이’의 느낌이나 이미지가 크게 어긋나진 않았다. 물론 촬영 중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선 끊임없이 이야기 하면서 진행 했지만 ‘창이’의
기본적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서로가 느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 같다.
‘창이’는 굉장히 일단 좀 지르는
캐릭터라고 해야 하나? 쿨 하면서도 잔혹하면서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현실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사람은 기꺼이 할 수
있으니까 연기 하면서도 짜릿짜릿한 느낌들이 있었을 거 같다.
<달콤한 인생> 때 한남대교에서 자동차 추격하던 친구들을 순간적으로
패고 차 열쇠를 강으로 던졌던 신이 있었다. 그게 바로 그런 ‘짜릿짜릿하고 통쾌한’ 신이었다. <놈.놈.놈>은 그 신의 연장선상이고
그걸 더 극대화시켰다고 보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게 달려갈 거다. 우리도 촬영하면서도 그런 기분이 있어야 몰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현실성이 없는 캐릭터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연기하는 입장에선 어디까지 질러줘야 하나 고민스럽진 않았나?
처음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혼란스러웠다. 어느 정도 선까지가 사실성에 근거해서 연기해야 하고 인물을 분석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살짝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론을 내렸다. 그런 건 영화 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 영화 성격, 장르와 인물의 강한
개성이 현실성이나 당위성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틀에 관해서 용서가 된다고 해야 하나. 관객들도 ‘저런 게
어딨어?’라는 편협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지는 않을 거 같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재미있었다. 의외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행동과 표정이 나올
수록 묘한 쾌감을 느꼈다.
어느 영화 속에서나 악당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희화화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면을 보고 이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창이’는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놈이고 살인청부업자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밥 먹듯이 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늘 ‘내가 최고다’라는 자존심 때문이다. 그게
되게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 캐릭터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거침없고 매력 있다. 기본적으로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제목 자체를 세 놈으로 했고 어쨌든 영화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면 나름대로 의 매력을 이미 장치적으로 넣지 않았겠나? (웃음)